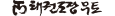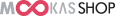[무인이야기] 조선의 칼장인 2- 청도의 검장인들
발행일자 : 2011-04-04 23:42:43
<글 = 허인욱 무술전문위원>


청도군에서 생산된 보검이야기

기산 김준근 대장장이
황윤석(黃胤錫, 1729~1791)의 '이재난고(頤齋亂藁)'에 기재되어 있는 '청도군(淸道郡)'에서 생산된 보검」조의 이야기를 보자.
얼마 전에 송일휴(宋日休, 1734~?)가 이런 말을 하였다. 우리나라는 청도군에서 나는 보검을 온 나라에서 제일로 친다. 그 시작은 어떤 벙어리 대장장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디서 왔는지 알 지 못하나 철을 다루는데 신묘하여 손을 대면 좋은 물건을 만들었다. 또한 정해진 가격을 바꾸지 않았다. 이로부터 그 무리들이 서로 기술을 전하여 점차 많아졌다.
근년에 김이원(金履遠, 1708生)이 청도군 원님이 되어서 그 아들 고 참판 김응순(金應淳, 1728~1774)이 관아에 따라와 지내면서 어떤 대장장이를 아껴 음식을 보내어 매우 많이 도와주었다. 대장장이도 그 성의에 감동하여 어느 날 찾아와 작은 검 한 자루를 바치면서 “이 검이 겉 장식은 비록 순박하고 누추하지만, 그 쇠는 수십 년간 수백 번 단련하여 완성한 것입니다. 감히 이것으로 보답하고자 하오니 행여나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지 마십시오. 남에게 주면 검은 반드시 다시는 보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김응순이 다만 받아두기는 했으나, 별로 보배로 여기지는 않았다. 후에 안산(安山)의 장인(庄人)인 원동지(元同知)라는 사람에게 주었다. 원동지는 그 칼을 날마다 써서 간혹 보리이삭을 따거나 간혹 담배를 썰기도 하였고, 간혹 함부로 숫돌에 갈기도 하였다.
어느 날 밤 갑자기 잠이 깨었는데, 한줄기 비린내 섞인 찬바람이 불어와 오싹하여 두려웠다. 불을 밝혀 바라보니, 한 마리 큰 뱀이 잠자리 가까운 곳에 들어와, 피가 질펀히 흐르고 맑은 물도 섞여 있었는데, 칼날이 뱀의 머리 한 중간을 꿰뚫고 있었다. 대개 뱀이 사람을 깨물려고 하자, 검이 저절로 움직여 뱀을 찌른 것이다. 원동지가 크게 괴이하게 여기고 이 일을 김응순에게 말하니, 김응순이 대장장이의 말을 생각해내어, 비로소 칼을 도로 찾았다.
이일을 대장장이에 말하니, 대장장이가 탄식하며, “보검에는 신령이 있어, 한 번 남에게 보이면 다시는 신령스럽지 못합니다. 신령이 아마 이로부터 흩어졌을 것입니다. 애석합니다. 영공께서 인연이 없으시군요.”라고 하였다. 원동지가 허튼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송일휴가 또 나에게 말해준다고 하였다.
송일휴가 또 말하였다. 청도 원님이 다스리는 곳에 어떤 칼 잘 만드는 장인이 있었는데, 원님을 찾아와 묵고 있는 손님에게 사랑을 받았다. 그 손님이 후한 값을 먼저 주고 칼 만들기를 재촉하였는데, 대장장이는 3~4년이 되도록 미루었다. 하루는 관아 안에 화로를 옮기고 손님을 청하여 날마다 단련하는 것을 보게 하였다.
어느 날 저녁에 은밀하게 말하기를 “오늘밤 모(某)시에 장차 담금질하려고 하는데, 보물에는 신령이 있어서 절로 꺼리는 게 많습니다. 행여 엿보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손님은 그가 다른 쇠로 바꿀까 의심하여, 몰래 벽 틈으로 그를 염탐하였다. 대장장이가 바야흐로 칼날을 화로에 넣었다 뺐다 하는데, 불이 이미 벌겋게 달아오르자 대장장이가 문득 주문을 외면서 홀로 기뻐하며, “천지간에 제일가는 보물이 완성되었다.”라고 하였다. 갑자기 손님이 염탐하는 것을 깨닫고는 칼날을 던지며 탄식하기를, “어찌 이리도 사람을 믿지 못합니까? 이 물건은 다시는 신령스럽지 못합니다.”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재촉하기를 매독 혹독하게 하여도, 끝내 만들려하지 않았다고 한다.
벙어리 신 씨로부터 시작된 경북 청도의 칼장인들이 매우 많아졌다고 하는 서술을 보면, 벙어리 신 씨에게 제자들이 있었고, 계속 대를 이어 칼 만드는 기법을 전하였던 듯하다. 하지만 이들의 이름이나 계보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는 남아있지 않아 아쉬움을 준다.
보검이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고 보리이삭을 따거나 담배를 썰기도 하는데, 역시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또한 칼을 만들기 위해 3~4년을 기다리는 칼장인을 믿지 못하고 몰래 훔쳐보는 손님의 행동은 작은 욕심 때문에 큰 것을 잃는 이들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여준다.
(이 글은 조혁상, '조선후기 도검의 문학적 형상화 연구', 성균관대박사학위논문, 2010에서 도움을 받았다).
<ⓒ무카스미디어 / http://www.mooka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카스를 시작페이지로
무카스를 시작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