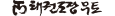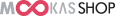[국선도 이야기] 점필재(佔畢齋) 김종직
발행일자 : 2013-05-03 16:34:30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정현축의 국선도 이야기 40

김종직(金宗直, 1431~1492, 세종 13년~성종 23년)은 자(字)가 계온(季昷)이며 호는 점필재(佔畢齋)이다.
조선시대 사림파(士林派)의 거두(巨頭)이기도 했던 그의 도맥은 국선도 무현도사(無絢道士)의 숙질이 되신다고 구전(口傳)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러나 선도(仙道)를 이단시했던 조선시대의 특성상 점필재 김종직의 선도수행은 청한자 김시습보다도 더욱 더 꼭꼭 감추어져 있다. 그것은 그가 관직(官職)에 몸 담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사실 수도(修道)는 비전(秘傳)으로서,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게 기본 전제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김종직은 수행의 정도(正道)를 묵묵히 지키며 걸었다고 할 수 있다.
男兒憂道不憂貧 남아는 도(道)를 근심하지, 가난을 근심하지 않으며
休把酸辛費受辛 괴로움을 삭이고 즐거이 받아들여
樂道方成快活士 기꺼이 도(道)를 즐기는 선비가 되니
安貧始作自由身 안빈으로 들어가는 자유의 몸이러라.
林間伏臘唯耽酒 여름에는 숲을 즐기고 겨울에는 한잔의 술을 즐기며
紙上功名却付人 종이 위 공명은 남들에게 주고
谷口子眞三徑詡 자진의 곡구와 장후의 삼경에서
芳規贏得後來伸 아름다운 규범으로 후세를 열리라.
시(詩)에서도 나타나듯이 그의 이상(理想)은 오직 도(道)의 실천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종(成宗) 임금은 이러한 그를 지극히 총애하여 이렇게 평가하였다. ‘단아하고 성실하고 거짓이 없으며 학문에 연원이 있다.’
학문을 세우고 인재를 육성하는 데 주력했던 김종직은 문하(門下)에 김굉필(金宏弼), 정여창(鄭汝昌), 김일손(金馹孫), 남효온(南孝溫), 홍유손(洪裕孫), 정희량(鄭希良), 유호인(兪好仁), 우선언(禹善言), 조위(曺偉) 등 걸출한 인재들을 많이 배출하였다.
그는 40세에 함양 군수로 부임되었는데, 가보니 대궐에서 차(茶)를 공물로 거둬들이는 현실로 인해 백성들이 고역을 치르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함양에서 나지도 않는 차(茶)를 구하기 위해 다른 지방까지 가서 어렵게 사다가 관청에 바치고 있는 것을 본 것이다.
그는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차(茶) 공물을 백성들에게 거두지 않고, 관청에서 스스로 구해 대궐에 상납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신라 때 지리산에 차의 씨를 심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기반으로 하여, 노인들에게 물어물어 마침내 엄천사 북쪽 대밭에서 차(茶)의 종자를 발견하였다.
이로부터 관청에서 직접 차밭을 재배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경남 함양군 휴천면 동강리 차밭(茶園)이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공물 바칠 차(茶)를 구하느라고 고생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우리나라 다도(茶道)의 시원(始原)은 본래 신라 화랑들로부터 비롯되었다. 화랑들은 명산대천(名山大川)을 다니면서 차(茶)를 즐기며 심신(心身)을 수련하였다. 그래서 지금도 강릉 경포대 한송정(寒松亭)에는 차(茶)의 달인이며 신라 당시 전국토의 인심을 풍미했던 영랑(永郞) 술랑(述郞) 남랑(南郞) 안상(安詳), 4선(四仙)이 차(茶)를 달여 마시던 다구(茶具)들이 지금까지도 유적으로 남아 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김종직은 신라 때부터 전해지던 씨앗 종자를 마침내 찾은 것이며, 그것을 찾느라고 고심한 흔적이 그의 시 〈다원(茶園)〉에 잘 나타나고 있다.
欲奉靈苗壽聖君 임금님 장수케 하고자 좋은 차 바치려 하나
新羅遺種久無聞 신라 때부터 전해지던 씨앗 종자를 찾지 못하다가
如今擷得頭流下 이제서야 두류산 아래서 구하게 되었으니
且喜吾民寬一分 우리 백성 조금은 편케 되어 기쁘네.
竹外荒園數畝坡 대숲 밖 거친 동산 수백평 언덕에
紫英烏觜幾時誇 자영차(紫英茶) 조취차(鳥嘴茶) 언제쯤 자랑할 수 있을까?
但令民療心頭肉 다만 백성들의 근본 고통을 덜게 함이지
不要籠加粟粒芽 무이차(武夷茶) 같은 명차(名茶)를 만들려는 것은 아니라네.
점필재 김종직은 평소에 ‘시(詩)는 성정(性情)을 도야(陶冶)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또한 반대로 시는 성정으로부터 자연히 우러나오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점필재는 스스로 많은 시들을 짓기도 하였지만, 신라 때부터 동시대에 이르기까지 백결선생, 고운 최치원 등 동방 선인들의 주옥같은 시들을 스스로 채집하여 수록하였으니 바로 《청구풍아(靑丘風雅)》였다. 그는 무욕(無慾)의 삶을 실천한 백결선생의 생에 감동하여 다음과 같은 시를 수록하였다.
東家砧舂黍稻동쪽 집에서는 기장과 벼를 방아 찧고
西家杵搗寒襖서쪽 집에서는 겨울옷을 다듬질하네.
東家西家砧杵聲동쪽집 서쪽집 방아소리 다듬이소리
卒歲之資嬴復嬴해를 넘길 곡식 넉넉하고도 넉넉하건만
儂家窖乏甔石우리집 광 속 쌓아 둔 곡식 없고
儂家箱無尺帛우리집 상자 안에는 명주 한 자도 없네.
懸鶉衣兮藜羹椀헤져 너덜거리는 옷과 명아주국 한 사발에
榮期之樂足飽煖영계기의 낙은 충분히 배부르고 따뜻하니
糟糠糟糠莫謾憂조강지처여 조강지처여 부질없이 걱정 마오.
富貴在天那何求부귀는 하늘에 달렸는데, 구한다고 되리요.
曲肱而寢有至味팔 베고 잠을 자도 지극한 맛 있으니
梁鴻孟光眞好逑양홍과 맹광은 참으로 좋은 배필이었다오.
명리(名利)에서 벗어나 가난하게 살면서도 세상 사는 맛을 알 수 있고, 부부의 정 또한 지극히 할 수 있다는 생활의 도(道)가 담겨 있다.
한편 함양에는 신라 때의 고운 최치원이 함양 태수로 있으면서 선정을 폈던 것을 기리기 위해 지은 ‘학사루(學士樓)’라는 누각이 있었다.
하루는 훈구파 유자광이 함양에 와 놀면서 그 학사루에 시를 써서 걸었는데, 함양 군수였던 사림파 김종직이 그것을 ‘소인배의 짓’이라 하여 철거시켰다.
이로 인해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훈구파에 의해 사림파가 참혹하게 화를 당하는 ‘무오사화(戊午士禍)’가 일어나는 빌미가 되었다.
1498년 무오년(戊午年, 연산군 4년) 《성종실록(成宗實錄)》을 편집하던 김일손이 작성한 사초(史草)에 스승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弔義帝文)>을 실은 것이 문제가 되어 ‘무오사화(戊午士禍)’가 발생한 것이다.
유자광은 김종직의 <조의제문(弔義帝文)>이 세조의 단종 폐위를 은유적으로 비판한 것이고, 선왕(先王)을 무록(誣錄)하는 큰 죄를 범했다며 연산군에게 상소하였다.
그러자 평소 청렴한 선비를 싫어하던 연산군은 유자광의 상소를 받아들였고, 길일손을 비롯한 김종직의 모든 제자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귀양을 가는 등 큰 화를 당하였다.
이미 6년 전에 죽은 김종직은 무덤을 파서 시신을 다시 한번 목 베는 부관참시(剖棺斬屍)를 가하였으며, 그의 문집 또한 모두 불태워졌다.
이때 형을 집행한 관료들이 사라지자, 어디선가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나 부관참시 당한 김종직의 시신을 지키며 슬피 울었다고 한다.
사람들이 시신을 거두어 현재의 위치에 이장하여 안장하니, 호랑이도 따라와 무덤을 지키다가 결국 무덤 옆에 쓰러져 죽었다고 한다.
이에 마을 사람들이 호랑이의 장례를 치러주고, 김종직의 무덤 옆에 묻어 주었다. 그리고 ‘인망호폐(人亡虎斃, 사람을 따라 죽은 호랑이)’라는 비석까지 세워 주었으니, 현재 밀양시 부북면 제대리에 있다.
이때부터 그 마을에는 도둑과 질병이 사라졌으며, 호랑이가 마을의 수호신이 되었다고 한다. 그 후 중종이 즉위한 뒤 문충공 점필재 김종직은 죄가 풀리고 관작이 회복되었으며, 숙종 때 영의정으로 추증되었다.
苟自圖於封殖兮만일 스스로 재물 모으기만 도모한다면
人誰食乎吾餘어느 누가 내 먹은 나머지를 먹으리오.
嫉世俗之洿濁兮세속의 더럽고 혼탁함이 가증스러워라.
驕妻子於白日백일 아래서 처자에게 교만을 부리네.
椒蘭隨以變化兮산초와 난초 또한 따라서 변화함이여
哀容長而無實겉모양만 거창할 뿐 실상 없음이 슬프다.
有蹈道之如矢兮화살처럼 곧게 도(道)를 실천함이여
羌羣咻而衆咥뭇 사람이 떼지어 지껄이고 비웃는구나.
徵往哲之芳躅兮선현들의 훌륭한 자취를 밟아 가보니
信余命之多諐참으로 나의 운명 잘못 된 게 많구나.
이처럼 점필재 김종직은 청빈하게 살면서 올바른 삶을 견지하였으니, 훈구파나 연산군에게는 적대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위 내용은 외부 기고문으로 본지 편집방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글 = 정현축 원장 ㅣ 국선도 계룡수련원]
<ⓒ무카스미디어 / http://www.mooka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작성하기
-
연휴를 이용해서 한번 여행해 보시지요? ^^
2013-05-1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0 0 -
정말 "인망호폐" 라는 비석이 밀양군 부북면 제대리에 있는지요 ?
실감나는 글 고맙습니다.2013-05-1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0 0 -
진리는 영원 한 것, 가까운 곳에 잇는 보배로다!!!
2013-05-1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0 0







 무카스를 시작페이지로
무카스를 시작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