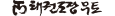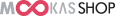[국선도 이야기] 국풍파(國風派), 정지상
발행일자 : 2013-01-11 14:18:57
<글. 정현축 원장 ㅣ 국선도 계룡수련원>


정현축의 국선도 이야기 37
 정지상(鄭知常, ?~1135)은 고려 예종에게 스승으로 신임과 총애를 받았던 곽여(郭輿, 1058~1130)의 문인(門人)으로, 1114년(예종 9년) 과거에 급제하였다. 그러나 정치적인 활동은 주로 인종 때에 빛을 발하였다.
정지상(鄭知常, ?~1135)은 고려 예종에게 스승으로 신임과 총애를 받았던 곽여(郭輿, 1058~1130)의 문인(門人)으로, 1114년(예종 9년) 과거에 급제하였다. 그러나 정치적인 활동은 주로 인종 때에 빛을 발하였다.스승 곽여와 마찬가지로 정지상은 신라 화랑도의 정신을 올곧이 이어받아, 자주 독립과 북벌정책을 주장했던 고려 대표적인 국풍파(國風派)였다.
인종 5년(1127년) 좌정언(左正言)으로 있을 때는 서릿발 같은 기상으로 권신 귀족 척준경을 탄핵하여 유배 보냈다. 척준경은 이자겸과 함께 인종에게 난을 일으켰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이자겸을 잡아 가두고 공신 자리에 오른 자로, 그 공로만 믿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발호하고 있던 터였다.
정지상은 나이 5세에 대동강에 떠 있는 해오라기를 보고 다음과 같은 시조를 읊은 신동(神童)이자 고려의 천재 시인이었다.
何人將白筆 어느 누가 흰 붓을 가지고
乙字寫江波 을(乙) 자를 강물 위에 썼을까?
이렇듯 시재(詩才)에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임금이 직접 참석하는 경연에서 고전 강의를 도맡을 정도의 실력파 정지상이 오만한 권신 귀족을 무서운 줄 모르고 베어내자, 당시의 서생들은 쾌재를 부르며 정지상을 추앙했다고 한다. 그의 시(詩) 〈대동강(大同江)〉과 〈송인(送人)〉은 당시 천하를 울린 명시(名詩)였다.
雨歇長堤草色多 비 멎은 긴 강둑 우거진 풀빛
送君南浦動悲歌 남포에서 임 보내니 슬픈 노래 울리네.
大洞江水何時盡 대동강 흐르는 물, 마를 때가 있을까?
別淚年年添綠波 이별 눈물 해마다 물결 위에 더 보태니.. 〈대동강(大同江)〉
庭前一葉落 뜰 앞에 낙엽 하나 떨어지니
床下百蟲悲 마루 밑 온갖 벌레 슬프구나.
忽忽不可止 홀홀이 떠남을 말릴 수는 없으나
悠悠何所之 그대 유유히 어디로 가는가?
片心山盡處 한 조각 마음은 산 끝에 걸리고
孤夢月明時 외로운 꿈결, 휘영청 밝은 달
南浦春波綠 남포의 봄 물결 푸르듯
君休負後期 그대는 부디 뒷기약 잊지 마소. 〈송인(送人)〉
이렇듯 정지상이 쓴 서정시는 한 시대 시(詩)의 수준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고려를 대표하는 천재 시인으로 자리 잡았다.
문인(文人)으로서 뿐만 아니라 정치에도 깊이 간여하던 정지상은 인종 7년(1129년) 좌시간으로 있으면서 시정(時政)의 득실을 논하는 소(疏)를 올리니, 왕이 이를 받아들였다.
정지상은 음양사상과 풍수 도참사상에도 밝아, 같은 서경(평양) 출신이던 묘청(妙清), 백수한(白壽翰)과 함께 서경 삼성(三聖)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정지상은 고려의 웅지를 크게 떨치려면 도읍을 서경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서경천도론과 북벌정책은 비단 정지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고, 일찍이 예종 때부터 국선의 중흥을 장려하며 계획하던 바였다.
그러나 윤관이 여진족을 정벌하여 동북(東北) 9성(城)을 설치하고 고려정계비(高麗定界碑)를 세웠을 때도, 사대주의 권신(權臣)들이 이를 반대하였다. 쓸모 없는 땅을 관리하느라고 국고만 낭비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예종은 뜻을 지키지 못하고 1년 만에 동북 9성을 돌려주었고, 윤관은 끝내 권신 귀족들에게 축출되었다.
이에 실망한 곽여가 궁에서 물러나 은거하기를 원하자, 예종은 궁궐 밖에 별장을 지어주고 스승을 붙잡은 것이었다.
정지상 등이 서경천도를 주장하는 바탕에는 당시 고려사회가 권신 귀족 세력을 대표하던 이자겸 척준경의 반란으로 왕권이 뿌리째 흔들리는 내우외환을 겪고 있었다. 그리하여 왕권을 확고히 세우려면, 왕기(王氣)가 서린 서경으로 천도함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국풍파 대표 정지상과 사대주의 대표 김부식의 대립은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관계가 형성되었다.
정지상은 서경출신의 신진세력으로 칭제건원(稱帝建元)을 주장하며, 왕권중심적 서경천도와 북벌정책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국풍파였다.
김부식은 기득권을 유지하던 개경출신 권신 귀족으로 대표적인 유교 사대주의자들의 수장(首長)이었다. 그러므로 정지상과 김부식은 정치적 문학적으로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시대의 라이벌이 되었다.
이즈음 서경에서 인종의 순시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던 묘청(妙淸)은 김부식의 방해에 돌연 분노하여 개경의 권신 귀족들을 향하여 난을 일으키니, 정지상이 이와 연루되어 김부식에게 피살되고 말았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정지상을 ‘1류 인물’로 평하면서, 이러한 능력 있는 인재가 그 역량을 국가와 사회에 펼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이렇게 갈파하였다.
“조선의 역사가 원래 낭가(娘家)의 독립사상과 유가(儒家)의 사대주의로 분립하여 오더니, 돌연히 묘청이 불교도로서 낭가의 이상을 실현하려다가 그 거동이 너무 광망하여 패망하고 드디어 사대주의파의 천하가 되어 득세하매, 낭가는 아주 멸망하여 버렸으니, 그 실상은 낭(郎)·불(佛) 양가 대 유가(儒家)의 싸움이며, 국풍파(國風派) 대 한학파(漢學派)의 싸움이며, 독립당(獨立黨) 대 사대당(事大黨)의 싸움이며, 진취사상 대 보수사상의 싸움이었으니, 이 사건을 어찌 1천 년래 조선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라고 않으랴!”
이는 사대주의로 무너진 다물(多勿) 정신을 안타까이 여기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심정이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고려 낭가는 현실주의적 유가들로부터 큰 타격을 받고 현저히 그 세력이 약해졌으므로, 1천 년래 조선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라고 했던 것이다.
즉 정지상과 묘청 등이 이겼다면, 조선사가 독립 진취적으로 나아갔을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그러면서 단재 신채호 선생은 이 사건에 대하여 말을 이었다.
“묘청의 행동이 광망하여 그 동당 정지상 등을 속이어 사지에 빠지게 하였으나, 그 칼끝은 왕이 아닌 개경의 귀족들이었다. 묘청이 스스로 왕이 될 욕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묘청의 거사는 앞서 이자겸이나 척준경의 반역과는 달리, 새롭고 자주적인 독립 국가를 세운다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낭가(郎家)는 매양 국체상에는 독립자주 칭제건원(稱帝建元)을 주장하며, 정책상에는 흥병북벌(興兵北伐)하여 압록 이북의 옛 강토를 회복함을 역창(力唱)하고, 유가는 반드시 존화주의의 견지에서 국체는 중화의 속국 됨을 주장하고, 따라서 그 정책은 비사후폐(卑辭厚幣)로 대국을 섬겨 평화로 일국을 보(保)함을 역창하여, 피차 반대의 지위에 서서 항쟁하였었다.”
“잔약, 쇠퇴, 부자유의 길로 들어감이 무엇에 원인함인가? 무슨 사건이 전술한 종교, 학술, 정치, 풍속, 각 방면에 노예성을 산출하였는가? 나는 일언하되, 고려 인종(仁宗) 13년(1135) 서경전역(西京轉役)이 김부식에게 패함이 그 원인이라 한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또 김부식이 정지상을 살해함은 정치적 목적 뿐만 아니라, 문예적인 질투가 크게 작용하였다고 말하고 있으니, 실재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서경의 반역을 평정하려면 정지상을 먼저 제거하지 않으면 안된다.” 김부식이 여러 재상에게 그렇게 말하고 정지상을 은밀히 불러들여 무사로 하여금 목을 벤 뒤에, 비로소 위에 아뢰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말하기를 “김부식은 평소 정지상과 같은 문인으로 명성이 비슷하였는데, 문자 관계로 불평이 쌓여, 정지상이 내응한다고 핑계하고 죽인 것이다.” 하였다.
그렇다면 김부식이 가졌던 정지상에 대한 ‘문자 관계의 불평’이란 무엇인가? 이규보(李奎報)의 《백운소설(白雲小說)》을 보자.
‘정지상은 시재(詩才)가 고금에 절륜(絶倫)하여 여러 문인들의 숭배를 받다가 김부식에게 죽었으므로, 후래의 시인들이 불평히 여기어 그에 대한 일화가 많이 유행하였다. 김부식과 정지상은 문장으로 함께 이름이 났는데, 두 사람은 알력이 생겨서 서로 사이가 좋지 못했다. 그 이유는 정지상이 쓴 다음과 같은 시 두 구절이 빌미가 되었다.’
琳宮梵語罷 절에서 독경 소리 끝나자마자
天色浮琉璃 하늘빛이 유리처럼 깨끗해졌네.
소리와 빛, 시간과 공간이 하나로 합일된 절묘한 구절이니, 시를 아는 김부식이 단박에 반하였다. 이에 김부식이 이 구절을 자기에게 달라 하고, 정지상이 거절하니 ‘문자 관계의 불평’이 생겼다는 이야기다.
즉 평소에 정지상의 빼어난 문장력에 시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김부식이 묘청의 난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씌워서 가차없이 살해했다는 이야기였다.
또 정지상이 “그대가 술 있거든 부디 나를 부르소서. 내 집에 꽃 피거든 나도 또한 청하오리. 그래서 우리의 백년 세월을 술과 꽃 사이에서...” 이 시조(時調) 1수를 지었더니, 김부식이 보고 이놈이 시조도 나보다 잘한다 하여 살해하였다고도 한다.
《백운소설》이 전하는 두 사람의 라이벌 관계는 정지상의 사후(死後)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어느 봄날 김부식이 흥취가 돋아, 다음과 같은 시를 읊었다.
柳色千絲綠 버들 빛은 천 가닥 푸르고 桃花萬點紅 복사꽃은 만 점이 붉구나.
그러자 공중에서 정지상 귀신이 나타나, 김부식의 뺨을 찰싹 때리며 이렇게 말하였다.
“일천 가닥이니, 일만 점이니, 바보 같은 소리 말라. 버들가지가 천 개인지 세어보았으며, 복사꽃이 만 개인지 헤아려 보았느냐?”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고쳐 주었다.
柳色絲絲綠 버들 빛은 실실이 푸르고 桃花點點紅 복사꽃은 점점이 붉구나.
천사(千絲)를 사사(絲絲)로 바꾸고, 만점(萬點)을 점점(點點)으로 바꾸니, 시의 품격이 훨씬 부드럽고 높아졌다. 이에 김부식은 정지상을 더욱더 미워하였다.
하루는 또 김부식이 뒷간에 앉아 똥을 누는데, 정지상 귀신이 김부식의 음경(陰莖)을 잡아당기며 물었다.
“술도 아니 먹었는데, 왜 얼굴이 붉느냐?”
“붉은 단풍이 얼굴을 비춰서 붉다.”
“이건 무슨 가죽 주머니냐?”
“네 아비 음경은 쇳덩이냐?”
김부식이 대꾸하며 버티니, 정지상 귀신이 더 힘을 써 김부식이 마침내 뒷간에서 죽었다고 한다. 이 또한 이규보의 《백운소설》에 전하는 이야기다.
이긍익(李肯翊)의 《연려실기술》 역시 두 사람을 비교하여 이렇게 표현하였다.
“김부식은 풍부하였으나 화려하지는 못하였고, 정지상은 화려하였으나 떨치지는 못하였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이와 같이 문예의 시기심도 한 원인이 되나, 대체로는 김부식은 사대주의의 괴(魁)요 정지상은 북벌파(北伐派)의 건장(健壯)이니, 만일 정지상을 살리어 그 작품의 유행을 허한다면 혹 그 주의가 부활할지 모르는 것이다. 이것이 김부식으로서 정지상을 살해한 최대의 원인이라고 하였다.
아무튼 문학사에서는 정지상이 복잡한 정치판에 휘말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시인(詩人)으로 남았더라면 하고, 한 귀재의 단명을 아쉬워하고 있다. 인종을 모시고 개성 서강(西江)가의 장원정에 갔다가 지은 다음 시는 시상이 참신하고 탈속(脫俗)한 작품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봉래산이 어디 있나 했더니 ‘지금, 여기’ 이 자리가 바로 봉래산이라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 봉래산은 선도(仙道)의 이상향으로 꼽히는 산이다.
岧嶢雙闕枕江濱 우뚝 솟은 대궐은 강 언덕을 베고 있어
淸夜都無一點塵 맑은 밤엔 도무지 한 점 먼지도 일지 않네.
風送客帆雲片片 바람에 불린 돛단배는 조각조각 구름 같고
露凝宮瓦玉鱗鱗 이슬 맺힌 궁궐의 기와는 비눌 모양 옥과 같네.
綠楊閉戶八九屋 푸른 버들 아래 문을 닫은 집은 여덟 아홉
明月捲簾三兩人 밝은 달빛에 주렴을 걷어 올린 사람은 두셋이라네.
縹緲蓬萊在何許 아득한 봉래산은 그 어디에 있을까?
夢闌黃鳥囀靑春 꿈을 깨니, 꾀꼬리 소리 봄을 알리네.
* 위 내용은 외부 기고문으로 본지 편집방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글 = 정현축 원장 ㅣ 국선도 계룡수련원]
<ⓒ무카스미디어 / http://www.mooka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카스를 시작페이지로
무카스를 시작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