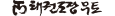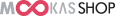영화 무사에 사용된 고려시대 병장기 알아보기
발행일자 : 2001-09-19 00:00:00
이재영 기자


여솔 정 우성의 기창
영화 무사에 사용된 고려 시대 병장기를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별로 알아보자
여솔 정 우성의 기창
누군가가 오래 쓴듯한 손때의 흔적과 세심한 세공기술이 돋보이는 여솔의 창.
모든 병장기 중 가장 먼저 완성되었다. 여솔의 창은 기본적으로 인도문화의 성격이 강하다. 여솔이 인도무사에게서 창을 얻는 설정이기 때문이었다. 창끝을 보면 세심하게 새겨져있는 문양이 서방문화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는 데, 이것도 인도문화의 영향이다. 또한, 창날과 창잡이의 연결에 신경을 많이 썼다. 창날과 창잡이의 연결부분에 가죽끈을 돌려서 사용하였는 데, 이것은 인도무사가 여솔의 창을 무척이나 아끼고 소중히 다룬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였다. 또한, 실크로도를 따라서 오랫동안 교역하면서 사용되어진 창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설정이었다. 창을 휘두를 때, 리듬감있게 흔들리도록 창날을 예리하게 만들어놓았는 데, 액션씬에서 세심하게 흔들리는 창날을 통해 보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한 의도였다.

1
기창의 역사에 대해서
기창(騎槍)은 장창(長杖)의 무예를 발전시킨 것으로, 말을 타고 이루어 지는 장창술(長杖術)을 말한다.이미 예(濊)에서 3丈길이의 창을 사용하였으며, 동옥저(동옥저)에서도 창을 잘 다룬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청동기시대의 출토물 중에 검이나 화살촉과 창이 함게 나오는 것으로 보아, 창의 사용은 매우 오래된것으로 보인다.
고구려의 창은 고분 벽화에서 그 모습을 찾을수 있다. 특히 마상 장창을 이용한 기창의 모습이 나타난다. 삼실총 고분 벽화에는 앞뒤로 2인의 기수가 말을 타고, 장창의 교전을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뒤에 있는 기수는 좌측에서 우전방 찌르기의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앞에 있는 기수는 오른손에 창을 쥐고 뒤를 돌아보며 경계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따라서 실제교전의 모습을 보여준다.
한편 안악 3호분의 대 행렬도에는 교전의 모습은 아니지만, 왼손에 장창을 쥔 기수가 행렬을 따라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런 모습은 쌍영총에서도 나타난다. 따라서 고구려에는 기창이 주요 무예의 하나였음을 알수 있다.
고구려 창의 형태는 단봉형(단봉형), 유엽형(유엽형), 검신형(검신형)의 3가지로 구분된다. 한편 백제의 창은 방추형(방추형), 검신형(검신형), 삼지창형(삼지창형)이 있다. 그리고 가야와 신라의 창은 서로 유사한데, 원추형(원추형),방추형(방추형), 검신형(검신형), 코가 있는 차모(차모:끝이 갈라진 창), 삼지창(삼지창)등이 있다.
최정 주진모의 검
최정 주진모의 검
섬세하고 날렵하지만 품위있는 디자인의 장군검.
최정또한 원기병의 검을 얻는 설정이어서, 원기병의 검에서 기본디자인을 가져왔다. 원나라 말기의 검은 크고 디자인이 화려하고 섬세하다. 하지만 최정의 검은 사이즈를 줄여 제작했다. 고려 아홉무사를 이끄는 최정에게 무겁고 투박한 느낌의 검보다는 날렵하면서 강해보이는 칼이 더욱 적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손잡이가 일반적인 검보다는 길게 제작되었는데, 이것은 배우의 연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칼의 시작부분에 있는 문양, 칼집에 새겨진 조각 등이 장군검의 품위와 위엄을 더해준다.

2
삼국의 도(刀).검(劍)은 먼저 고구려가 북방 민족의 도.검 문화를 접하면서 고구려 특유의 문화로 발전시켰다. 이 후 백제와 신라는 고구려와의 교류를 통하여 이전의 도.검 문화에 새로운 고구려의 도.검문화를 흡수하여 그들 고유의 도.검문화를 형성하였다.
고구려는 한반도의 북방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북방 민족과의 교류를 통하여 예술 양식과 세공기법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고구려는 이러한 것들을 자주적인 양식이나 기법으로 발전시켰다. 문화적인 자주의식은 고구려가 북방의 여타 민족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배경을 이루었다.
중국의 고서인 『한화고구려유(翰花高句麗柔)』를 보면 "한반도 사람들은 도려(刀礪)를 차고 이로써 등위를 나타내었고, 금우(金羽)로써 귀천을 밝혔다"고 하였다. 이는 검을 항상 패용하고, 검으로써 신분을 나타낼 수 있을 정도로 검이 널리 사용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고구려의 철제 대도는 백제와 신라, 가야에까지 전하여져서 드디어 삼국시대는 철제 대도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철제대도는 다시 일본에까지 전하여져 일본 도.검의 원류를 이루었다. 일본의 옛 기록에서 보이는 맥검이나 고려양대도(高麗樣大刀) 등은 일본 도.검의 이름이 고구려의 환두대도와 검을 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병기의 종류는 많지만 크게 장병기長兵器와 단병기短兵器로 나누어진다. 장병기는 창槍과 곤棍을 위주로 하고, 단병기는 검劍과 도刀를 위주로 한다.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에 『칼의 양편에 날이 있는 것을 검劍이라하고, 한편에만 날이 있는 것을 도刀라고 한다. 후세에 와서 도刀와 검劍이 서로 혼용되었다. 고대에는 검을 숭상하고 후세에는 도를 숭상하였으니, 이것은 무기로서의 예리하고 둔한 것이 관계된 것이 아니고 모두 습속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으며, 또한 『대체로 검劍은 고제古制이나 오늘의 요도腰刀로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였다.
진립 안 성기의 활
진립 안 성기의 활
진립의 활은 진립이 왜 활을 사용하는가에서부터 도구디자인이 시작되었다.
진립은 주진군의 우두머리이면서 명궁이고, 고려무사들의 정신적 지주이다. 활은 민첩한 움직임을 강조하고, 먼거리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이다. 따라서 진립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면서 전투하기에는 적절한 무기이다.
진립의 활은 두 종류가 제작되었다. 작은 활은 활동성을 가볍고, 활동성이 강해 진립이 전투에서 많이 사용한다. 또, 일명 현월궁이라 불리우는 커다란 활은 진립의 위치와 위엄을 나타내기에 좋은 활이다.

3
고구려의 활은 그 성능이 뛰어나 이웃나라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기록도 많다. 즉 위지(魏志)에 보면 "고구려 별종(別種)이 소수(小水:서안평 북쪽에 있는 강)를 근거로 나라를 세웠는데 이로인해 나라이름을 소수맥(小水貊)이라 하며 좋은 활이 나오니 소위 맥궁(貊弓)이 이것이다."라고 하였고 중국 남송의 학자 여조겸(呂祖謙)의 와유록(臥遊錄)에는 "한나라 헌제(獻帝) 건안 10년(고구려 山上王때) 처음으로 익주(翼州)를 정하니 예맥(濊貊)이 질좋은 활을 공물로 바쳤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맥은 고구려가 예맥의 땅에서 일어난 나라이므로 당시 중국에서 고구려를 지칭할 때 쓰던 말이다. 또한 우부강표전(虞溥江表傳)에서는 "오나라 손권(孫權)시대에 고구려는 사신을 보내 각궁(角弓)을 바쳤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손권이 즉위한 때는 고구려 산상왕(山上王) 26년(222년)이므로 이 때에 벌써 고구려가 각궁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단궁과는 다른 맥궁이 곧 각궁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도 할 수 있다.
고구려 고분 벽화에 보이는 활은 거의 예외 없이 형태상으로는 만궁이고, 길이는 단궁이다. 외관상으로 명백하게 합성궁임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무용총에서 호랑이를 겨냥하는 그림의 활)도 있고, 그 외에도 전체적인 모양에서 유추해 볼때 거의 모든 활이 합성궁임이 확실하다.벽화상으로 볼때 고구려의 활은 조선시대의 각궁과 유사한 종류의 활이라고 단정 할 수 있다.
가남 박 정학의 도

4
가남 박 정학의 도
가남의 도(刀)는 가남이 최정을 호위하는 무장의 느낌이 강하다. 가남은 최정을 그림자처럼 호위한다. 따라서 가남의 도는 커다랗고, 보기만 해도 위협을 느끼게 해주는 느낌이어야 했다. 하지만 가남의 도는 전장터를 지나면서 습득하는 설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원의 모양을 본떴다. 또한, 가남의 도는 거대한 사이즈로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커다란 사이즈를 유지하면서, 가볍게 그리고 배우가 액션연기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 제작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그래서 손잡이를 가늘게 하고, 가죽으로 묶는 설정을 가죽처럼 보이는 천을 사용해무게를 줄여야 했다.
하일 정 석용의 단창
하일 정 석용의 단창
하일의 단창은 창에 밧줄을 묶어놓은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다. 하일이 사냥꾼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해 창을 던졌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한, 일종의 부메랑 원리를 이용한 설정이다. 또한, 동작이 민첩한 하일에게는 크기가 큰 무기보다는 그의 민첩함을 도와줄 수 있는 작지만 예리한 무기가 어울린다. 그런 면에서 가볍고, 쉽게 휘두를 수 있는 단창은 하일에 안성맞춤이다

5
고구려의 창은 대부분 투겁창 계열이며 창 계열은 드문 편이다. 이는 고구려 뿐 아니라 신라, 백제, 가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창날의 몸체는 양날 칼 모양(검형)이고, 단면이 능형(다이아몬드 모양)인 투겁창이다.
고구려의 경우 실물 이외에도 벽화고분에서 참조할만한 것이 몇개 있다. 특히 벽화 고분에서 눈에 띄는 점은 고구려의 보병이 연으로 생각되는 짧은 창을 들고 있는 점이다. 같은 벽화에서 기병이 들고 있는 창과 비교해 보면 길이가 두드러지게 짧아 단순히 표현상의 문제는 아니고, 실제로 짧은 창일 가능성이 있다. 연은 중국의 전한 및 후한시대에 널리 사용되었던 무기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평남 강서군 대성리 제13호 토광묘와 경남 김해군 양동리 235호 토광목곽묘에서 출토된 바 있어 고구려에서 연을 사용했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도충 유 해진의 도끼
도충 유 해진의 도끼
도충의 도끼는 무게를 줄이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었다. 다혈질적인 도충의 성격을 드러내기에는 보기에도 위협적인 도끼가 제격. 게다가 처음 나온 도끼 디자인의 사이즈가 너무 커서 제작해도 배우가 도저히 연기할 수 없는 크기였다. 무게를 줄이려면 안을 비워야 하는데, 안을 비우면서 무게감을 잃지 않게 제작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도충의 무기답게 커다랗고 위협적이지만, 전장터에서 원기병의 병장기를 습득하는 설정이므로, 원기병다운 화려한 문양을 넣어 커다랗고, 섬세한 느낌을 동시에 주었다.

6
高句麗 안악 3호 고분에 나타난 대행렬도에는 쇠도끼를 어깨에 맨 여러 군사(도부수)의 모습이 보인다. 쇠도끼(鐵斧)는 대도와 마찬가지로 근거리 접전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삼국의 고분 벽화에서 보아 알 수 있다.태종 무열왕 7년(660)에 소정방(蘇定方)은 백제 군사를 격파하고 약속에 늦게 돌아온 김유신 일행을 꾸짖고 휘하의 장수를 참형하려 하였다. 그러자 김유신은 쇠도끼인 철월(鐵鉞)을 잡고 서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자 소정방은 그 기세에 눌렸으며 결국 김유신의 말에 설복 당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와 같이 쇠도끼가 전쟁용으로 사용되었음을 많은 기록에서 알 수 있다. 특히 삼국 시대에는 기마 전법이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전쟁의 주요 전술로 대두되며 철갑과 판갑으로 무장한 중장기병들의 엄청난 위압감은 전쟁의 승패에 막대한 영향을주었을 것이다. 이때 일반적인 검이나 창만으로 중장기병이나 중무장한 병사에의 공격은 엄두도 못 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삼국 전쟁사를 보면鐵斧(도끼)로 상대를 공격하여 살상한 기록이 많이 전하여 지고 있는 것이다.
고구려 안악 3호 고분에 등장하는 도부수(도끼부대)의 잔영은 삼국 시대 도끼로 중무장한 부대의 실체를 나타내는 것이라 본다. 또한 신라와 백제간의 전쟁에서도 도끼로 살상한 기록이 많이 나오고 있다. 삼국 시대 도부수들은 각기 중무장을 한 부대의 선봉장으로서 그 패도적인 위용을 자랑한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임금의 행차시나 의례시에 등장하는데 무과시험(전시)에 임금이 친히 행차하여 시험을 주관하는 자리에 의장용으로 나타나는 은월부(銀鉞斧) 금월부(金鉞斧)가 있고, 이것의 특징은 단부의 형태로 되어 있다. 단부란 한쪽으로만 날이 있는 도끼의 형태다.
또 다른 모양의 은작자 금작자가 있다. 이것 또 한 도끼의 형상을 띄고 있지만 은작자, 금작자의 모습은 양쪽으로나비 모양의 날이 있으며 가운데 중심부에는 창 촉처럼 철촉이 달려있다. 두 모양의 다른 점을좀 더 상세히 밝히기로 한다.
은월부, 금월부는 나무로 만들며 은(銀)으로써 바르고 주칠봉(朱漆棒)에 꿴다. 이 은월부는 1인이 든 모습이 나타나고 현재 대한제국 시대에 사용한 유물 한 점이 창덕궁에 소장되어 있고, 그 제원은 총길이 252㎝, 월부(鉞斧) 길이 23.5㎝, 월부 폭 14㎝, 월부 두께 6㎝, 대길이 210㎝, 대 직경 3.5㎝이다. 금월부(金鉞斧)는 나무로 만들며 금(金)으로써 바르고 주칠봉(朱漆棒)에 꿴다. 이 금월부도 1인이 들고 간다. 역시 대한 제국 시대에 사용한 유품 한 점이 창덕궁에 소장되어 있고, 그 제원은 총 길이 275㎝, 용두장(龍頭長) 23.5㎝, 용두 폭 17.5㎝, 대길이 220.5㎝, 대 직경 4㎝이다.
은작자(銀斫子)는 나무로써 도끼와 같이 만드는데, 양쪽 날은 은(銀)으로써 바르고 주칠봉(朱漆棒)에 꿴다. 인 은작자는 1인이 들고 간다. 유물은 없으나 금작자(金斫子)를 통해서 크기나 형태를 알수 있다.
금작자(金斫子)는 나무로써 도끼와 같이 만드는데, 양쪽날은 금(金)으로써 바르고 주칠봉(朱漆棒)에 꿴다. 이 금작자 역시 1인이 들고 간다. 현재 창덕공에 金斫子 한 점이 소장되어 있는데, 금색의 용두(龍頭)가 좌우에 있고, 1마리는 부(斧)를 물고 있다.
이와 같이 철부와 은작자, 은월부, 금월부 등 다양한 종류의 도끼가 전하며 전쟁터에서 활용되는 중장기의 무기로서, 조선시대 임금의 행차 儀禮시에 등장 하는 의장용으로서 여러 형태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또한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도끼는 생활 도구로서도 정착되어 왔으며 그 모습은 고대의 것과 현대의 것이 별반 차이가 없다. 전국 박물관에서 자주 보이는 철부는 전형적으로 한국적인 모습이다.
99년 9월 19일 안산에 소재하고 있는 경일 정보 산업 고등 학교 실내 체육관에서 제 1회 전국 베기왕 대회가 열렸다. 전국에서 많은 선수들이 모였고 나름대로 닦은 기량을 선보이는 자리가 되었다. 대회에 앞서 전통 검도의 시연을 맡아 우리 검의 옛 모습과 착용법, 복식 등을 재현하여 전통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중 처음으로 철부를 재연하여 선보였다. 도끼를 기록에 의거하여 제작하였고 그 기예를 닦은 박춘식, 정효교 등이 두정 갑옷을 입고 머리에 복두를 쓴 모습으로 철부를 메고 장내로나오자 여기저기에서 수군수군대며 장내가 시끄러워졌다. 철부를 메고 있는 모습은 전통 검도 대회의 모든 사람들 눈에는 처음으로 접하는 것으로 낯설고 무언가 어색한 우리에게서 먼 거리에 있는 모습으로 다가 왔을 것이다. 두 사람이 철부를 사용하여 기예를 펼쳐 보이자 그 위용과 기술, 기세에 눌린 많은 사람들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한 침묵을 지키며 바라보고만 있었다.
기예를 펼치던 두 사람이 끝을 맺자 우뢰와 같은 박수로 그들을 격려 하였다. 이렇듯 우리 무예의 근원적인 모습에 다가가면낮설지만 처음보고도 친근함이 느껴지는 것은 우리 마음 속 깊이 내재되어 있는 아득한 고대의 향수같은 것일 것이다.


댓글 작성하기
-
결국 고려의무기는없네
2001-11-3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0 0







 무카스를 시작페이지로
무카스를 시작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