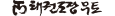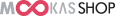<태권도로 읽는 노자 도덕경 ③> 태권도를 태권도라 부르지 마라?
발행일자 : 2025-05-01 07:10:39
수정일자 : 2025-05-01 07:10:39
[엄재영 / kaikans@hanmail.net]


노자의 ‘도가도 비상도’, 무도 태권도는 어디로 가는가
▶ 노자가 말하는 도(道)란 무엇인가?
▶ 道可道, 非常道, 名可名, 非常名(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번 3부에서는 본격적인 노자 도덕경의 본문을 탐색한다. 본문 1장을 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다.
“道可道, 非常道, 名可名, 非常名”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많은 사람이 노자의 도덕경 읽기에 도전하지만, 이 본문 1장 1단락의 “道可道, 非常道, 名可名, 非常名”(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를 읽고 50%는 책을 덮는다고 웃으며 말한다. 해석하는 필주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많은 책을 읽어가며 다양한 해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도를 도라고 말하면 진정한 도가 아니요, 이름을 이름이라고 부르면 진정한 이름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를 태권도로 해석하면 태권도를 태권도라고 부르는 순간 진정한 태권도라고 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본문 1장 1단락은 『노자 도덕경』 전체의 핵심적인 서문이며, ‘도’는 말은 표현할 수 없는 궁극적인 우주의 원리이고 오묘하며 노자 도덕경이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도’대한 언급이 반복된다.
1장 3단락에서는
“無, 名天地之始, 有, 名萬物之母”
(무, 명천지지시, 유, 명만물지모)
라는 말이 나온다.
이 말을 임채무 선생은 이를 이름이 없을 때 무욕으로 그 신묘함을 바라보고, 이름이 생겨난 뒤에는 유욕으로 그 돌아감을 본다고 해석한다. 또 김시천 선생은 항상 욕심이 없으면 그 신묘함을 보고 욕심이 있으면 그 돌아가는 길을 본다고 해석했다.
두 사람의 해석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무(無)욕심을 버리고 보면 오묘한 경지를 보고 유(有)욕심을 가지고 보면 그 끝 가장자리를 본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
양 교수는 이 말을 태권도로 해석하면 태권도에서 무심(無心)이란 말이 나오는데, 생각을 차분히 하고 아무 생각도 없는 고요한 상태라는 것이다. 노자 도덕경은 유(有)에서 무(無)로 가는 개념으로 유(有)보다 무(無)가 고수의 개념이며 노자 도덕경은 고수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수의 길 가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외에도 본문 1장 마지막 4단락에서는
“此兩者, 同出而異名, 同謂之玄. 玄之又玄, 衆妙之門”
(차양자, 동출이이명, 동위지현, 현지우현, 중묘지문)
라고 하여 천지(天地)는 하늘과 땅을 의미하고 이름이 다를 뿐이고 같은 뜻으로 하늘은 현(玄)이라 하여 검고, 지(地)땅은 황(黃)이라 하여 누르다는 말인데, 현(玄)과 황(黃)은 검고 넓다는 뜻의 동의어로 깊고 깊음을 나타내는 뜻하는 말로 천지(天地)는 모든 신묘함이 나오는 문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이를 태권도로 해석하면 기술의 도(道)라는 것은 깊고 깊어서 그 깊어서 할 수 없다. 그래서 도(道)는 오묘함과 신묘함이 나오는 문으로 해석했다.
자세한 내용과 전체적인 내용의 요지는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 엄재영 사범 = 대망태권도장 ㅣ kaikans@hanmail.net]
<ⓒ무카스미디어 / http://www.mooka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엄재영 |
| 현)대망태권도관장 전)대한태권도협회 이사 전)북경체육대학교 교수 대한민국 체육훈장 기린장 수훈 2024 홍콩세계태권도품새대회 코치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금메달(2011)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금메달(2020) |









 무카스를 시작페이지로
무카스를 시작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