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1920년대 수박! 영상,독립운동가 김원보 선생 추정, 조선총독부 지원 국책 교육영화 포함
영상 속 체격 큰분 성함이 김원보인데 이분 관련해서 이후 영화쪽에서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다.
같이 출연했던 박순봉의 경우 1970년대까지도 활발한 영화계 참여가 있던 반면에,,,
따라서, 감독을 맡았던 이규설이 이 영화 관련해서 민간인(영화인이 아닌) 김원보를 섭외(격투장면 촬영을 위해서) 했을수도 있다는 생각에(총 18분 분량 영화에서 격투장면이 1분이나 된다) 사회 다른 계통에서 김원보를 추적 했다.
이규설은 아리랑을 연출했던 나운규와 함께 아리랑에도 출연했었다.
나운규는 독립군단체와 관련을 맺으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청회선터널폭파미수사건’의 용의자로 잡혀 1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친 뒤 1923년 출감하였다. 1924년 부산에 조선키네마주식회사가 설립되자, 부산으로 내려가 연구생이 되었다.
해방 되고나서 이규설은 북한으로 갔다.
김원보도 독립운동사 쪽으로 정보가 확인된다.
2022년 김원보는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영화에서 그의 나이가 20대 후반~ 30대초로 보인다.
김원보가 1919년 만세운동 관련 보안법 위반으로 판결을 받은 자료와 비교할때 나이대가 딱 들어 맞는다.
최근 공개된 날파람 관련, 평안도 실향민 1,2세대 증언으로는 일제강점기 황해도, 평안도에 수박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보니까 전부 보부상, 장돌뱅이들이 하더라, 자기들끼리 모여서 연습하기도 했다 등 언급과 관련해서 위 판결문상 김원보의 고향이 황해도다.
◇선생6: 그래, 그 양반 살아 계실 때, 내가 듣기로는 황해도, 평안도 쪽에 수박이라는 걸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 스스로도 보셨고, 그래서 내가 우찌 하는건데요? 물어보니,
손바닥도 쓰고, 주먹도 쓰고, 씨름처럼 잡고 넘기고 그런다 카데.
그런데 이 양반들이 가만보면 전신에 보부상들이라, 장돌뱅이라 이거지. 전국을 다니니까 도둑도 만나고 할거아이가, 그러니까 온종일 걷다가 잠깐 쉴 때 모여서 그걸 연습하고 그랬다는거야.
영상에서 김원보가 보여주는 것과 상기 증언에서 황해도 지역(평안도는 편의상 제외) 수박의 형태가 일치한다.
손바닥도 쓰고, 주먹도 쓰고, 씨름처럼 잡고 넘기고 그런다 카데.
개성은 현재 황해북도다.
김원보와 황해도- 개성- 수박 연계가 필자만의 생각이 아닐수도 있다.
(아직까지는 추정이다. 더 자료 추적을 할 생각이다)
영상의 격투는 1920년대 서울과 개성의 수박, 함경도 주먹치기(수박 별칭)으로써 충분한 개연성을 가진다!
총 18분 시간 중 격투에 할애한것이 1분이다!
무슨 액션 영화도 아니고 일제가 조선을 계몽 한답시고 제작 지원을 했던 일제 국책사업 일환으로써 열심히 근로하기를 권장하고 저축을 해라? 뭐 또 행복해진다? 이런 제작 목적을 가진 무성 영화에서 1분을 치고 받고 있다.
따라서, 감독(지휘)을 했던 이규설이 1분간 진행되는 격투장면을 대충 찍었을것이란 생각은 적당하지 않다.
지금도 그렇지 않은가?
복싱 기술이 필요하면 배우들이 복싱 체육관 가서 그 기술을 배운다.
유도가 등장 할때는 유도 전문가가 자문을 하기도 하고 직접 출연하기도 한다.
이는 그 부분의 (격투의)전문성을 제고하기 때문이다.
총 18분 분량의 영화에서 1분간이나 전문성도 없이 막싸움? 이나 찍고 일제 국책 교육영화로써 제작비를 받아 챙겼으리란 것은 넌센스다.
제작진의 활동 시기상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국 영화로 추정된다.
여기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김원보(영상 두사람중 체격이 큰 이)가 상대역 박순봉과 함께 찍은 격투장면은 대수롭게 볼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김원보(당시 기준으로 키, 체격이 크다. 무예를 익혔던 이로써 풍채가 만만찮다)
필자가 김원보를 추적 했으나 관련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다.
희극 작가 송영의 작품 관련 한번 등장할 뿐이다.
그에 반해서 박순봉은 1970년대까지도 활발하게 영화에 참여했었다.
우측 김원보
필자는 김원보의 영상을 분석,해제해서 학술연구물 등재 및 단행본에 수록 할 예정이다.
우선, 얘기해 둘것은 영상의 격투모습을 대충 보고 막사움이니? 개싸움이니? 하는 이들도 있는듯하다.
지금의 UFc나 MMA도 이와 별반 다르지가 않다.
입식 타격 외에도 넘어뜨리기 등 지금의 격투 지식에 부족하지 않다.
김원보는 영상에서
1 (안정된)자세
2 무게 중심 유지
3 이동-걸음걸이(보법)
앞과 뒤 그리고 측면 돌기 등
4 앞손과 뒷손 구분 사용
5 몸으로 타격 회피
6 손,팔로 막기(방어)
7 잡고 치기(멱살)
8 주먹 바로치기, 좌,우 교대로 치기, 복부치기, 내려치기
9 양팔을 위에서 아래로 교차해서 막기, 타격 연계
10 목 감아 넘어뜨리기
11 (넘어진 상태로)상대 멱살부위 잡고 받아치기
특히, 상대가 진행하는 힘을 비껴서 흘리거나
측면으로 이동할때도 그냥하지 않고 오른손, 또는 왼손을 상대쪽에 뻗어 거리를 재고
공간을 좁혀서 압박하는 등 격투 관련 전법에서도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동작, 움직임 등을 전제로 김원보가 막연하게 막싸움식?으로 한것이 아니란것을 알 수 있으며 당시 김원보가 접했을 조선 전래 체기(수박 및 주먹치기, 민둥씨름)에 대해서 많은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상대역 박순봉의 경우 김원보와는 차이가 크다.
[여담]
2001년에서 2년께로 기억된다.
필자는 전,대한검도회 부회장, 경기도 검도회장 역임하셨던 검농 김재일 선생으로부터 연변대학교 허일봉 교수와 함께 재현 하셨던 조선세법, 본국검 등을 김재일 선생님 댁인 서울 화곡동 옆 공원에서 직접 배웠었다.
한날 김재일 선생님이 필자한테 어디 같이 가자하셔 그분 차에 타고 올림픽회관인것으로 기억되는곳으로 갔는데
김재일 선생님이 "대한택견회 이용복이 만나고 올테니(김재일 선생님 말씀이기에 존칭 생략함) 차에 있어라" 하셨다.
그리고 돌아 오셔서 필자한테 "이용복이가 뭐, 예용해, 예용해 그러던데 봤다 하대?" 하시며 양팔을 위에서 아래로 교차해서 하는 동작을 "이용복이가 이래 한다던데?" 등 얘기하신 바가 있다.
예용해 선생은 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역임하신 분으로 해방후 동대문 근처에서 노인 몇분을 만났는데 수박희를 우리말로 수벽치기라고 한다.
그분들 얘기로는 손을 주로 쓰는거다!라고 증언 한것이 알려져 있다.
예용해>이용복>김재일로 전해진 해방후 동대문 근처 노인 몇분이 하던 동작은 김원보가 격투장면 마지막쯤 보여주는 동작들과 형태가 같은거다.
필자한테 택견은 언제쯤 나와요?
묻지 마라!
안 나온다! ㅎㅎ
영상 후반부 경성청량우편소라는게 나오는것으로 봐서
촬영은 서울에서 진행 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서울과 인근의 개성에서는 수박이 전승되고 있었다.
1900년 출생 권태훈옹- 서울지역 증언
1919년 출생 오진환옹- 개성지역 증언
1932년 출생 송창렬옹- 개성지역 증언
그리고 권태훈, 송창렬 증언과 최근의 평안도 실향민 증언(날파람 관련), 북한 민속학자 홍기무 <조선의 민속놀이>를 살펴볼때 영상의 주먹 위주 격투는 서울과 개성에서 전해지던 수박 및 함경도에서 수박을 일컫던(별칭) 주먹치기로 이해된다.
서울과 개성 지역 구분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었다.
오진환 증언으로는 인천 모래내바닥이나 수원 형무소 등도 왜정때 개성권에 속했었다 한다.
근로의 끝에는 가난이 없다(일본어: 稼に追付く貧乏なくて)는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제강점기 한국 영화이다. 이규설이 감독을, 박순봉과 김원보가 출연하였으며, 무성 영화로서 조선어와 일본어 자막이 달려 있다.
감독 이규설은 나운규의 《아리랑》 (1926년)에서 주인공 영진의 아버지 역으로 출연하였으며 당해 《농중조》를 감독하였다. 이외에도 제작진의 활동 시기상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국 영화로 추정된다.[1]
2019년 한국영상자료원이 러시아 영화 아카이브 고스필모폰드에서 발굴하여 입수한 작품으로, 2021년 6월 발굴복원 작업을 거쳐 특별전을 통해 유튜브와 KMDb로 공개되었다.[1]
위키 인용
(일제강점기 격투)1920년,맨손 격투,나운규(함북 회령),이규설(함남 함흥) 연출,북한지역 격투 인식 보여준다,출처 한국영상자료원
일제강점기 격투,발견됐다.
ㅡㅡㅡ
일재 당국지원 받은 국책 교육영화에 포함된것.
고증 없이 동작들 연출 못했으리라 여겨진다.
아리랑 나운규 연출에 출연했던 이규설이 감독으로
일본인 촬영 기사가 촬영했다.
필자가 여기에 주목하는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다.
1)시대
1920년대는 서양식 복싱이나 일본 유도, 가라테도 등이 조선에서 활발히 보급되던 시기가 아니다.
2)인물
이규설은 출생지가 함경남도 함흥이다.
25세때, 서울 소재(추정)의 윤백남프로덕션에 들어가 <심청전>에서 촌민역할을 맡으면서 영화에 입문하였다(대중예술인 사전)
3)일본의 지원을 받은 국책 교육영화라고 한다(한국영화진흥원)
4)고증
지금도 그렇지만 영화란것이 무턱 대고 촬영되는게 아니다.
각본이 있어야 되고 배우는 거기에 따르게 된다.
1920년대 필름이 흔치않던 시기, 배우들한테 너희들 마음데로 해라?
그러면 촬영한다?라는것은 있을수 없다.
격투장면, 동작들 하나하나 감독(이규설)의 지휘하에 짜여진것이란 얘기다.
그런 관계로 영상의 격투 동작들은 당시, 조선 사람들의 격투 관련
인식 하에 촬영됐다 여겨진다.
서울과 개성에서 전해지던 수박 및
1900년 출생 권태훈옹 증언- 일제강점기 함경도에 주먹치기가 유명했다!
최근 평안도 실향민 증언(날파람 관련)- 일제강점기 함경도 주먹을 알아줬었다!
함경남도 북청에서도 수박을 했다!- 고,송창렬옹 증언
1963년 북한 민속학자 홍기무 교수- 수박은 주먹질 하는것!
등 복수의 증언들과 동작을 지휘했던 이규설 출생지 함경남도 함흥을 연계할때, 함경도 주먹치기(수박의 함경도 지역 별칭) 형태가 포함 된것으로 보인다.
이규설
Lee Gyu-seol / 李圭卨 / 1902 ~
대표분야
배우, 감독
활동 연대
1920, 1930
불망곡 (이규설, 1927)
홍련비련 (이규설, 1927)
농중조 (이규설, 1926)
근로의 끝에는 가난이 없다 (이규설, 1920)
출처 : 한국영화인 정보조사
함경남도 함흥 출신이다. 1925년 윤백남프로덕션에 들어가 <심청전>에서 촌민역할을 맡으면서 영화에 입문하였다(대중예술인 사전). 그러나 윤백남이 <심청전>의 판로 확보에 실패하자 프로덕션은 곤란에 빠지게 되었다(동아일보). 이후 윤백남프로덕션의 동인들이 설립한 계림영화협회로 옮겨가 활동하면서 <장한몽>(1926), <산채왕>(1926)에 출연하였다. 1926년 조선키네마프로덕션에 들어가 <농중조>의 주연을 맡았다(동아일보b). 이규설이 <농중조>의 감독이라는 설도 있다(김종원). 1926년 말에 이규설은 서봉옥과 함께 토성회를 설립하고 자신이 각본을 쓰고 연출한 <불망곡>(1927)을 내놓았다. 이규설이 각본을 쓰고 감독을 맡은 다른 작품으로는 1928년의 <순정은 신과 같다>도 있다. <홍련비련>(1927), <회심곡>(1930)등 다른 감독의 작품에도 꾸준히 출연하였다. 해방 후 월북하였다(김종원).
* 참고문헌
동아일보a 1925년 7월 2일 3면.
동아일보b 1926년 11월 20일 5면.
<<식민지 시대 대중예술인 사전>>, 소도, 2006.
김종원, <<한국영화감독사전>>, 국학자료원, 2004.
[작성: 김영진]
[감수: 김종원]
원본 영상 6분 43초부터~ 7`분 45초까지 격투장면







 무카스를 시작페이지로
무카스를 시작페이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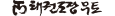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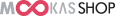







의견쓰기 (익명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