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조수란?
응조수라는게 어떤무술이며 익히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무카스 | MOOKAS |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495, 무카스사옥 301호 | 전화 : 일반 문의 : 1544-4869(구인구직/체육관매매/온라인 서비스) | 광고 사업 문의 : 031-937-8208(무카스미디어, 광고, 업무 제휴 및 협약 등) | 팩스 : 무카스 대표 팩스 : 070-5133-7196 / 무카스플레이온 팩스 : 031-937-3207(미디어 및 광고 관련) | 미디어 및 광고, 사업 제안 관련 : haeny@mookas.com
대표이사: | 사업자등록번호: (주)무카스 130-86-32224(대표이사 이승환) | (주)무카스플레이온 260-86-02619(대표이사 한혜진) | 사업자등록정보 확인 | 통신판매업 : 제2016-경기파주-0783호 | 청소년 보호 정책 책임자: 한혜진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기 아51401 | 등록일 : 2007.05.03 | 발행인 : (주)무카스 이승환 | 편집인 : 한혜진 | 기사제보 : press@mookas.com | 카카오톡 : 무카스
Copyright ⓒ [2007] Culturemaker All rights reserved, The MOOKAS™ is a ® Registered Tradem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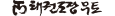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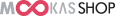


답변하기 (익명보장)
ychany
응조수라면..응조권(鷹爪拳)
■ 응조권의 특징 ■
응조권,정식명칭 [응조번자권]은, 이름 그대로, 독수리가 먹이를 잡는 모양을 참고한 움직임으로 기법이 형성된 북파권법이다. 정식으로는, 독수리가 먹이를 잡을 때의 동작이 아닌, 잡을 때의 발톱을 본뜬 [응조수(鷹爪手)]라는 손 모양을 나타낸다.
공방의 때에는, 이 응조수로 상대를 치고, 상대의 기(技)를 받아 낸다. 공격과 방어 어느 쪽을 하던지, 먼저 응조수를 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 후는,단숨에 연타를 구사함으로서 승부를 낸다.
또한,응조수에 의한 공격은, 항상 상대의 눈이나 사타구니,점혈 같은 급소를 노린다. 방어 시에도 상대의 공격을 받아 냄과 동시에 응조수로 상대의 점혈을 찔러 넣는다. 이 점혈에 찔러 넣는 기법은 [사경(死勁)]이라 불리는,응조권 독특의 경법이라고 알려져 있다.
[독수리의 발톱과 같은 손에 의한 연타로 상대가 쓰러질 때까지 끊임없이급소를 찔러 넣는다]는 것이 응조권이다.
■ 역사와 배경 ■ (TOP)
응조권은 송 대(960-1279) 중엽의 무장으로서 이름을 떨친 악비(岳飛)라는 인물이 원형을 만들어 냈다고 한다.
발상지에 대해서는,하북성이라는 설이 유력하지만 상세한 연대와 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단언은 할 수 없다. 다만,청대(1644-1911)까지,하북성 이 외의 지역에서의 전승이 확인되지 않았던 경위로 봐서 발상지에 대해서는 거의 분명하다고 말해진다.
■ 응조권의 완성 ■ (TOP)
역사상 기록에 응조권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다른 많은 문파들과 마찬가지로,명대의 기효신서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이 기록에 의하면 유사사(劉士梭)라는 권사가 악비가 남긴 [분절쇄골법(分筋鎖骨法)]과 [사경응적(死勁 敵)]이라는 두 가지의 기법을 중심으로 응조권의 기법을 완성했다고 한다.
분골쇄골법은 72종에 이르는 신체의 단련법으로,현재에도 권사들의 수련법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으로서,발경을 점혈에 찔러 넣는 108가지 방법의 집대성이며 사경응적과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기법상 빠질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 때문에,응조권은,그 두 가지 기법을 산출한 악비가 원형을 만든 인물로, 그것을 근본 기법으로 완성을 이룬 것이 유사사라고 불려진다.
■ 실전성을 높이려다 야기된 쇠퇴 ■ (TOP)
유사사에 의해 완성을 본 응조권은 근대에 이르러 응조번자권으로 이름을 고친다. 번자권의 기법을 대폭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것은,응조권의 전승자 중 하나였던 진자정(陳子正)(1883-1938)이 1910년에 상해정무체육회에 교사로서 초대되어 갔던 것이 계기가 된다. 상해 정무체육회는,수 많은 문파의 보급 활동을 했던 것으로 유명했던 조직이다. 진자정은 뛰어난 수완으로 응조권에 국기(國技)로서 거기에 모인 권법의 기법을 첨가해 실전성을 높이려 했다.
그 중에서도 비슷하게 연타를 구사하는 기법이 뛰어났던 번자권에 주목, 순식간에 승부를 결정짓는 응조권의 특징을 높여,정무체육회에서 교육한 권법 중에서도 최고의 것으로서 자리잡는데 성공했다. 그 때문에,응조권은 태극권,당랑권과 더불어 {정무삼대문파(精武三大門派)}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정무체육회의 활동을 추진했던 청조가 붕괴하면서,응조권은 쇠퇴하게 되었다.
중화민국(1912-1949)의 건국과 더불어 국술관이라는 새로운 무술 전승 조직이 만들어졌으나 응조권은 그다지 추천되어지지 못했다. 이유는,청대 진자정 때문에 눌려지냈던 타 문파들로부터의 불평이 국술관 창설자들의 귀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말해지나 사실인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 일반적으로는, 언제나 급소를 공격하는데서 오는 위험성 높은 권법이란 것이 보급을 꺼리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는 설이 유력하다.
응조권 쇠퇴의 역사는 우수했던 높은 실전성을 증명한다.
■ 주된 전승 지역 ■ (TOP)
응조권의 발상지는 하북성이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그 점은,악비에서 유사사에 이르기까지 전승이 하북성 웅현(雄縣)에서 이루어졌다는 서적 등의 기록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이다.
전승 지역에 대해서는 발상지인 하북성과 정무체육회가 있었던 상해 이 외에는 특정한 곳이 없다. 정무체육회의 영향에 의해 청 대에는 중국 전지역에 보급되었다고하나,그 높은 공격력이 위험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현재에는 존재가 확인되는 지역이 적다.
특히 남파로 구분되는 지역에는, 별로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다. 북파에 있어서도,팔극권이나 태극권같은 문파가 번성했기 때문에 현재에도 번창한 곳은 발상지인 하북성밖에 없다.
근래에는 일본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각국에서 기술공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응조권은 쇠퇴해간다기 보다는 발전을 해 나가고 있다.
서양에서도 보급이 시작되었으나 응조권이 근래 붐을 일으켰던 중국 무술 영화에서 악역(惡役)이 쓰는 권법으로 등장한 일이 많았기 때문에 별로 인기는 높지가 않다.
■ 격투 이론 ■ (TOP)
응조권은,순식간에 빈틈에 밀착할 때까지 접근하여, 연타를 구사하여 승부를 내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다. 그 때문에, 빈틈을 놓치지 않도록,응조권의 권사는 끊임없이 상대를 탐색한다. 독수리가 먹이를 잡을 때 계속 탐색하듯이, 상대가 빈틈을 보이는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다.
눈의 움직임은 단순히 상대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를 공격하기 쉬운 위치로 유도하기 위해서도 사용한다. 시선을 특정 부위에 둠으로서, 상대에게 자신이 그 곳을 공격하려는 것처럼 생각하게 해,[허]를 유도한다.
상대를 탐색할 때의 자세는, 그대로 공방을 전개할 때의 자세도 된다. 등과 무릎을 구부리고, 버팀이 되는 다리를 앞으로 내고, 반대 다리를 어깨 넓이 정도 벌리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응조수를 가슴높이에 둔다.
축이 되는 손을 가볍게 팔꿈치를 구부려 앞으로 내밀고, 반대 손을 자신의 몸에 밀착시키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다.
응조수는,엄지손가락을 제 1관절, 나머지 4개의 손가락도 제 1관절과 제 2관절을 구부려, 손바닥에 밀착시킨 모양이다.
공격을 하기 위해 상대와의 간격을 맞출 때에는, 발을 교차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기본이다.
발을 교차함으로서, 가랑이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한다.
공격과 방어의 양면에 있어 시작점이 되는 응조수를 구사할 때에는 특별히 축이 되는 다리를 펴고 반대쪽 다리를 앞으로 크게 내딛는다. 내딛음을 크게 함으로서 평소보다 강한 발경을 내게 된다.
응조수로 치는 법은 목표 부위에 따라 다르나, 단순히 직선적으로 찌르는 것이 아니라 찔러올리거나,쓸어내리듯이 하던가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것은, 상대에게 공격의 궤도를 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머리나 목을 중심으로 하는 상반신을 노릴 때에는, 먼저 몸을 낮게 해서 찔러 올린다. 반대로 가랑이나 하복부인 하반신을 노릴 때에는 쓸어 내리듯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찔러 올릴 때에는 손등, 혹은 손가락의 등,쓸어내릴 때에는 손끝, 혹은 장을 상대에게 맞힌다. 찔러 올릴 때의 목표는
코끝이나 턱같은 얼굴의 급소에 한정한다.
반대로 쓸어 내릴 때에는 눈이나 목, 옆구리, 사타구니를 시작으로 하여 점혈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의 바
리에이션도 많아, 이쪽이 공격의 중심이 되어진다.또, 목이나 협복에 수평으로 응조수를 찌르는 방법도 있으나 부위가 한정
되어 있고,찔러올릴 때보다 공격의 궤도가 읽히기 쉽기 때문에 사용 빈도는 낮다.
방어시에는,상대가 안면이나 상반신을 공격해 올때에는,찔러올리거나 또는 수평으로 내지르며 응조수 그대로 받아 막는다. 하반신을 공격해 올 때에는 쓸어 내린다.
이렇듯, 상대의 공격에 대해 가장 유효적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응조수를 쓴다.
방어 시의 응조수는,상대의 공격을 받아 흘리지 않고, 받아 멈추도록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상대의 공격을 막아 움직임을 봉하면서 그대로 점혈 혹은 관절을 누른다.
또한, 상대를 필요 이상으로 상처 입히지 않고 전투 불능으로 만들고 싶을 때에 한해서 점혈이나 관절을 누른 상태에서 다른 쪽 손으로 손목이나 팔꿈치의 관절을 비튼다.
첫 공격, 혹은 방어 시 상대의 급소를 찌르는데 성공한다면 바로 다음 공격으로 이어진다.
이때에도 응조수로 급소를 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발차기도 쓴다.
그러나,발차기는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리기 위해 쓴다.
상대의 상반신이나 안면을 노리는 경우는 없고,가랑이등의 하반신의 급소를 차기 위해서만 쓴다.
가랑이 등을 찰 때에는, 상대가 쓰러질 가능성이 높으나 그 때에도 눈이나 목 같은 전투 불능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한 점혈을 응조수로 찔러, 확실히 쓰러뜨린다.
발차기는,첫 공격이 되는 응조수를 상반신에 쓴 다음에 쓰는 경우가 많다.
서로 다른 부위를 공격함으로서, 상대의 의식을 혼란시키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첫 공격이 실패한때에도 공통된다. 상대에게 공격이 방어 당했을 경우에도,응조수의 손끝으로 피부나 옷 끝을 움켜쥠으로서 그곳에 의식을 집중시킨다.
응조권의 권사가 손끝을 철저히 단련시키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응조권의 싸움법에 있어서, 급소를 노리는 것이 제일이 되기 때문에 응조수에 의존하는 요소가 크다.
응조수를 방어당하면,응조권사는 공격할 수단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응조권의 수련 과정 ■ (TOP)
응조권에서는,기법을 배우는 투로와 함께,응조수를 단련하기 위한 연공법을 중점적으로 한다.
연공법은 분절쇄골법이라 불리는 72종류의 단련법이다.
어느 것이나 돌이나 나무,쇠알갱이같은 단단한 재질의 것에 손을 두두리는 방법으로 하며, 단련하는 부위나 치는 대상이 다를 뿐이다.
또한,분절쇄골법을 한 후에는 그 문파만의 비전 조합에 의해 만들어진 약탕에 손을 담그지 않으면 곪거 하기 때문에 응조권은 습득에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권법이라 불린다.
● 기술명 : 인절장(引切掌)
● 종 류 : 응조수(鷹爪手)
찔러 올리거나, 혹은 쳐 내리면서 응조수의 손 날 부분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기술이다.
기본적으로는 쳐 내리는 동작과 함께 쓰는 경우가 많으나 상대의 머리 옆부분이나 목근육,목을 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기술명 : 응번비운(鷹 쑹飛雲)
● 종 류 : 응조수로 시작되는 연속기
공격을 응조수로 받아 냄과 동시에 상대의 몸을 밟고 올라가듯이, 가랑이와 목을 연속으로 차는 고도의 기술.
먼저 상대의 공격을 응조장으로 받아 냄과 동시에 다른 손의 권으로 상대의 턱을 올려쳐 상대의 목을 무방비로 만든 다음 가랑이에 발차기를 하고 계속해서 상대의 다리를 밟고 올라가 목을 찬다.
● 기술명 : 반완타고수( 般腕打叩手)
● 종 류 : 응조수로 시작되는 연속기
상대의 공격을 양손으로 받아서 흘려, 자세가 무너진 곳에 공격을 찔러 넣는 기술.
주로 상대의 찌르기에 대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의 공격 부위를 응조장을 쥐는 요령으로 옆으로 잡아채 흘린다. 보통 응조장은 상대의 공격을 받는 것과 동시에 점혈을 찔러 고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 기술의 경우에만은 받아서 흘린다.
받아서 흘린 후는 옆으로 뻗은 팔을 거두는 힘을 이용하여 응조장을 머리 옆부분이나 옆구리에 찔러 넣는 경우가 많다. 단, 받아서 흘리기 때문에 옆으로 뻗은 팔을 거둬들이는 동작이 크기 때문에 상대의 자세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으면 반격의 틈을 줄 가능성이 높다.
● 기술명 : 답( )
● 종 류 : 발차기
응조권에서 발 안쪽으로 찌르듯이 차는 모든 발차기를 통칭한다.
무릎에서 발 앞 끝에 걸쳐 움직이며 차기 때문에 다리를 펼 필요가 없다.
정강이나 가랑이같은,하반신의 급소를 노리는 것이 목적.
● 기술명 : 슬봉(膝峰)
● 종 류 : 손바닥 치기에서 무릎 차기
응조수로 상대의 자세를 고정시킨 뒤,무릎차기를 하는 기술.
응조수로 상대의 특정 부위를 고정시킨 뒤, 가랑이, 혹은 명치를 차는 경우가 많다. 머리카락을 잡고서 차는 것이 기본이다.
문파에 따라서는 항문 부근을 차는 기법을 확립해 놓고 있는 곳도 있으며 그 경우는 상대의 목을 잡아 밀고서 찬다.
상대의 자세를 고정시킨 뒤 차기 때문에 최초의 응조수가 정확히 맞을 경우, 피할 수가 없는 기술이다.
● 기술명 : 찬권(鑽拳)
● 종 류 : 뒤집은 주먹으로 치기(응조수)
응조수를 뒤집은 주먹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기술. 간순히 공격으로 쓸 경우에는 쥐는 요령으로 옆으로 휘두르듯이 치지만, 그것보다도 방어 후의 대응기로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의 공격을 응조수로 받아,점혈을 누른 후, 손 날로 치는 것이 기본. 노리는 부위는 턱이나 목, 자신이 몸을 낮춘 경우에 한해서 가랑이가 된다.
● 기술명 : 조( )
● 종 류 : 손바닥 치기(응조수)
응조수로 복싱의 훅처럼 옆으로 휘둘러 치는 기술.
단, 단순히 응조수의 손가락 끝과 손바닥 부분으로 치는 것만이 아니라, 명중하기 직전에 손목을 꺽듯이 스냅을 줘서 상대의 피부를 당기듯이 친다.
그 때문에 높은 살상력을 기대할 수 있다.
명중시키는 장소는상대의 머리나 옆구리를 주 목표로하며,머리를 노릴 때에는 당기는 것 분만 아니라 그대로 머리카락을 잡아서 상대의 자세를 무너뜨리는데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응조수의 가장 일반적인 사용법이 되는 기술이다.
* 용어 설명: 축이 되는=체중이 실리는, 혹은 동작의 중심점이 되는.
==============================================================================
이 글은 하이텔 무예동 이윤석님의 글에서 퍼온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하이텔 무예동 이윤석님의 글
2004-07-12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