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름이 일본으로 건너가 스모가 되었다

씨름은 상대방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지 않고도 겨룰 수 있으므로 신사적이고 평화적인 무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름이 무예의 성격을 가질 때는 그 파괴력이 유도나 다른 격투기를 능가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 동안에 택견은 금지되었지만 씨름은 금지되지 않았고, 각희(脚戲)라고 표기되면서 단오 같은 명절에 지방대회는 물론 1927년 제1회 조선씨름대회를 시작으로 전국대회도 열렸다. 일제 강점기에 조선씨름협회 회장을 지내고 해방이 되자마자 조선국술협회를 만들었던 이극노는 씨름에 무예와 기예의 두 가지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
“씨름은 무예(武藝)의 한가지로, 그 발달 보급된 원인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호신적으로 방어와 공격의 필요에서 생긴 것이요, 둘째는 기예적으로 흥행이 되어 다른 연극이나 영화와 같이 구경꾼을 모아놓고 재미있게 구경하게 하는 운동으로 생긴 것이니 전 조선 어느 곳이나 씨름을 아니하는 곳이 없다.”
오래된 기록에 씨름은 각저(角抵), 각력(角力), 상박(相搏/相撲) 등으로 표기되고 있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전투적인 이미지는 두 황소의 싸움이다.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뿔을 맞대고 겨루는 싸움이 각저나 각력이었던 것이다. 씨름에서 이긴 최후의 승자인 천하장사에게 황소가 부상으로 수여되는 것은 여기에서 연유한다.
씨름이 한글로 처음 표기된 것은 1447년 편찬된 ‘석보상절’에 실린 실흠이었다. “조달이와 난타가 서로 실흠하니 서로 힘이 같거늘 태자가 둘을 잡아 함께 넘어뜨리시며 대신염광이라 하리라.”라고 쓴 것이다. 석가모니의 일대기인 이 책에서 왕실의 태자 석가모니가 사촌형제인 조달 및 난타와 무예연습을 하는 장면을 묘사한 대목이다. 세 명 모두 무예에 출중했지만 씨름에서는 석가모니가 두 형제를 가볍게 이긴다는 내용이다.
씨름의 어원은 최고의 씨가 되겠다고 겨루는 경기를 말한다. 씨름은 ‘씨’와 ‘힐후다’가 결합되어 명사화 된 말이다. 한국의 옛말 ‘힐후다’는 다투다, 승강이질하다, 논쟁하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씨름은 씨힐훔 > 실흠 > 시름 > 씨름으로 변천이 된 것이다. 힐훔이 다툼이라는 뜻으로 쓰인 예는 1459년 ‘월인석보’에 말다툼을 입힐훔이라고 표기한 데서 알 수 있다. 입+힐후다가 명사화한 단어로, 17세기 말의 ‘역어유해’에는 입힐흠, 18세기의 ‘한청문감’에는 입히롬으로 나온다.
이 씨름은 7세기 무렵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스모로 발음이 되기 시작한다. 일본어에는 종성이 없기 때문에 시름 > 시르모로 변하고 ㄹ이 탈락되면서 시모가 되었고, 이것이 스모(相撲)가 되었다. 한국 씨름이 오키나와로 건너가 시마(角力)라고 불리게 된 것은 13세기라고 보인다.
일본 역사 기록에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스모는 642년 백제 사신을 접대하기 위한 자리에서였다. ‘일본서기’에 “백제의 사인(使人)인 대좌평, 지적 등 벼슬아치 및 수박(手搏)에 능한 무인(武人)을 일본 조정에서 초청하여 일본의 무술인과 상박(相搏)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그것이다. 여기서 상박(相搏)은 상박(相撲)과 표기가 다를 뿐 그 뜻은 똑같다.
씨름의 원래 뜻이 씨다툼이라고 하는 근거는 어원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유일한 도구인 샅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샅바는 사타구니의 원형인 샅에다 줄을 뜻하는 바를 합쳐 부르는 말이다. 과거에는 씨름에 쓰이는 샅바를 삼으로 세 가닥을 지어 굵다랗게 꼬아서 만들었는데, 차츰 무명이나 광목이 등장하여 현재까지 통용되고 있다.
한국 씨름은 손잡이에 따라서 샅바씨름과 띠씨름 있었다. 샅바씨름은 지금과 같이 무명으로 만든 샅바를 다리에 끼어 허리에 둘러매고 그것을 잡고 하는 것이고, 띠씨름은 허리에 띠를 매고 그것을 잡고 하는 것이다. 이 띠씨름은 충청도와 경상도에서 했고 그 밖의 다른 지역에서는 샅바씨름을 했는데, 1927년 조선씨름협회가 생기면서 샅바씨름으로 통일시켰다. 과거에는 샅바나 띠를 굵은 새끼줄을 사용했다.
일본의 스모는 샅바를 잡지는 않으나 9미터쯤 되는 긴 무명을 사타구니와 허리에 두른다. 오키나와 씨름은 허리에 띠를 두르는 띠씨름이다.
샅바가 원래 새끼줄이었다는 것에 중요한 상징이 숨어 있다. 새끼줄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새끼, 즉 자손의 줄이다.
조선시대에는 여자가 장사의 샅바로 속옷을 해 입으면 득남한다는 속설이 있어 부르는 게 값이었다. 소 한마리 값은 주어야 구할 수 있었다. 50-60년전만 해도 부잣집에 아들을 낳아 주고 팔자를 고치던 기생들은 앞다투어 샅바를 구하려고 장사에게 축하주를 가장한 접대주를 올렸다고 전해진다. 장사의 샅바는 좋은 씨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일본 스모에 착용하는 샅바는 마와시(回し)라고 한다. 스모에서 마와시는 매우 신성시되며, 경기중에 마와시가 풀렸을 경우에는 경기와 관계없이 패배로 인정해 버린다. 스모의 천하장사에게는 굵다란 새끼줄이 부여된다. 스모의 천하장사를 요코즈나(橫綱-よこづな)라고 하는데, 그가 차지한 굵은 새끼줄도 요코즈나라고 불린다. 즉 요코즈나는 새끼줄을 획득한 자이므로 최강의 남성을 뜻한다. 스모를 장려한 것은 일본 왕가의 여인들이 스모의 명인들로부터 최고의 씨를 받기 위해서였다는 설도 있는 만큼 요코즈나의 인기는 예나 지금이나 영웅적이다.
요코즈나의 한자 표기는 횡강(橫綱)으로서, 요코는 가로 세로 할 때의 가로이며, 즈나는 굵은 밧줄을 뜻한다. 즉, 가로줄인데, 이는 순 한국어의 씨줄과 같은 말이다. 씨줄은 원래 베를 짜는 실이다. 씨줄을 그냥 꼬면 새끼줄이 되고, 날줄과 함께 짜서 천으로 만들면 샅바가 된다. 베는 씨줄과 날줄로 서로 엇갈리면서 짜게 되는데, 세로 줄을 날줄이라 하고 가로 줄을 씨줄이라 했다. 날줄 사이를 씨줄이 지나가면서 천이 짜지는 것이데, 전통적으로 씨줄은 남성에 비유되고 날줄은 여성에 비유되었다.
요코즈나는 한국의 씨름과 같이 씨 다툼에서 이겨 그 씨줄을 획득한 자를 말한다. 씨줄이 새끼줄, 샅바, 마와시로 변형되었다. 그런데 이 새끼줄의 원형은 왼새끼 세가닥으로 꼰 금줄이다. 한국인의 후예임을 알리는 금줄은 일본과 오키나와에 지금도 걸려 있다.
일본 사람들은 유도와 유술의 근거를 스모라 하고, 오키나와 사람들은 가라데의 근거를 시마라고 한다. 결국 유도나 가라데는 한국에서 전래된 씨름에 힘 입어 생겨난 것이다.
공감
0
비공감
0







 무카스를 시작페이지로
무카스를 시작페이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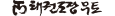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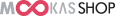



의견쓰기 (익명보장)
노무현
팩트나 근거자료 하나도 없고 이게 무슨 소리야 ㅡㅡ2019-11-18 수정 삭제 신고
saok1
강민수 선생님 요즘 선생님의 글을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한번 유선으로 통화했으면 합니다. 관리자 메일 press02@mookas.com 이나 회사 연락처: 02-32988-3708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010-12-09 신고
kctkd
찬성입니다.2010-12-05 신고
mskang00
오늘 이종격투기 세계챔피언을 지낸이각수 선생을 만난 자리에서 몇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 씨름과 합기도의 연결고리는요?"
"분명히 있습니다."
"오키나와 왕가의 비전술인 투이티를 보신 소감은요?"
"함기도라고 봅니다,"
"씨름과 태권도의 관계는요?"
"제가 평가할 입장은 아닙니다."
2010-12-04 신고
02ksm12
고로,돌고 도는 세상...
2010-12-03 신고
hyj9330088
결론은,"일본 사람들은 유도와 유술의 근거를 스모라 하고, 오키나와 사람들은 가라데의 근거를 시마라고 한다. 결국 유도나 가라데는 한국에서 전래된 씨름에 힘 입어 생겨난 것이다."
2010-11-15 신고